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따라 국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한 손해배상금 65억여 원 중 배상의무자인 의료인・의료기관에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음에도 의료인・의료기관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우선 국가가 지급한 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대불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은 2012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20건에 대해 64억 8,449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이 의료인・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이 중 약 10.6%에 해당하는 6억 8,451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재원은 대불금을 지급한 후 배상책임 있는 의료인・의료기관에 15일 안에 해당 금액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는데, 무려 58억 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중재원은 지속적으로 구상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0년 상반기까지는 중재원 직원이 구상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했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법무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 강제집행 등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액이 거의 61억 원에 달한 것에 반해 구상액은 3억 5,591만 원(약 5.8%)에 불과했으나, 법적 조력을 받은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추가적으로 3억 2,861만 원을 돌려받아 구상률을 10.6%로 끌어올렸다. 올해는 대불금 지급액(3,300만 원)보다 구상액(6,557만 원)이 더 많다.
그럼에도 여전히 절대적으로 낮은 상환율이 문제다. 특히,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앞둬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는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불금 상환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배상의무자가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여느 민사채권과 같이 사법기관을 통해 재산 현황을 조회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배당을 받아야 한다. 배당을 받을 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책임 있는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사실상 구상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재고하고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상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중재원의 구상권 행사를 지원할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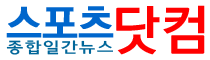










 - 이상식 의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부에만 열중”
- 이상식 의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부에만 열중”









